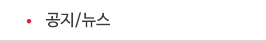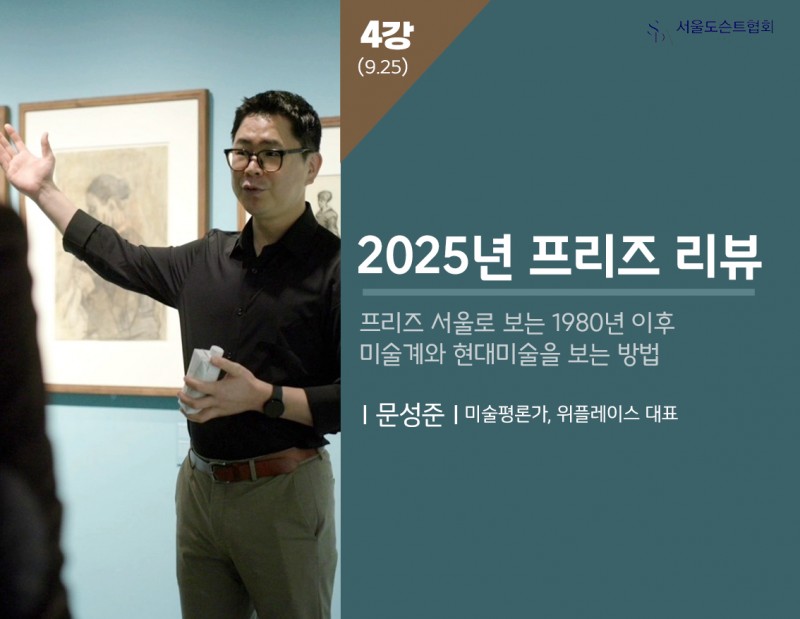2025 가을학기 제 4강 프리즈를 통해 읽는 현대미술
페이지 정보
작성자 SDA 댓글 0건 조회 1,959회 작성일 25-10-02 11:15본문
프리즈 서울과 1980년 이후 미술계
이번 강의는 단순한 프리즈 서울 리뷰가 아니라, 1980년 이후 세계 미술시장의 흐름과 현대미술의 방향성을 프리즈 서울을 통해 살펴보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문성준 평론가는 프리즈가 끝나면 관심도 끝난다는 솔직한 인식에서 출발해, 미술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동시대 미술이 처한 현실을 분석해 주셨습니다.
매너리즘과 질적 도피
프리즈 서울 현장에서 가장 크게 느껴진 점은 매너리즘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도가 줄어들고, 이미 검증된 작가와 익숙한 작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는 시장 침체 속에서 팔리는 작품 위주로 구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신진 작가와 소규모 갤러리는 설 자리를 잃고, 대형 갤러리 중심의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 이후 반복적으로 나타난 미술시장의 사이클과도 이어져 있음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크 브래드포드(Mark Bradford)와 사회적 추상
2025년 프리즈 서울에서 가장 주목받은 작품은 하우저앤워스(Hauser & Wirth)가 선보인 마크 브래드포드의 〈Okay, then I apologize〉(약 62억 원에 판매)였습니다. 브래드포드는 사회적 추상(Social Abstraction)을 대표하는 작가로, 광고 전단과 생활 속 인쇄물을 활용해 도시와 사회의 풍경을 추상화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어머니의 미용실 경험 등 개인적 배경에서 출발했지만, 국경·언어·소외와 같은 보편적 담론을 담아내며 세계적 지위를 확립했습니다. 강의에서는 브래드포드가 단순한 회화 작가가 아니라 사회참여형 예술가로 평가받는 맥락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작품의 성공적인 판매 배경에는 하우저앤워스와 같은 메가 갤러리의 전략적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짚어주셨습니다.
Art & Market Ⅰ1980년 이후의 전환
1960~70년대 개념미술과 퍼포먼스가 판매되지 않는 예술을 지향했다면, 1980년대 이후에는 다시 시장 친화적 회화(특히 신표현주의, Neo-Expressionism)가 부상했습니다. 이는 냉전, 자본, 미술시장 구조가 맞물리며 형성된 흐름이었으며, 현재까지도 게르하르트 리히터(Gerhard Richter)같은 작가가 롱텀(Long-term)지표의 최상위에 자리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시대와 전시의 변화
스마트폰과 인스타그램의 등장은 미술 전시의 형식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이제 전시는 단순히 작품을 보여주는 공간이 아니라, SNS에 인생샷을 남기기 좋은 장소가 되어야 관람객의 관심을 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포스트 인터넷 아트(Post-Internet Art)라는 새로운 흐름을 낳았으며, 리처드 프린스(Richard Prince)의 인스타그램 차용 작업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마무리
프리즈 서울은 한국이 글로벌 미술시장의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시장 침체, 검증된 작가 쏠림, SNS 시대의 전시 변화라는 현실 또한 드러냈습니다. 문성준 평론가는 예술가의 성공은 결국 시장과 비평, 컬렉터의 영향 속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하시며, 우리가 현대미술을 바라볼 때 단순히 작품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시대적 맥락과 구조를 함께 읽어내야 한다고 마무리하셨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